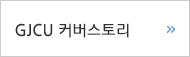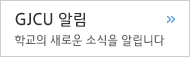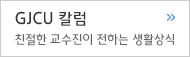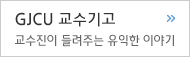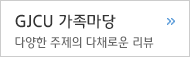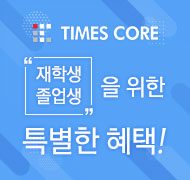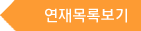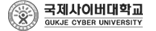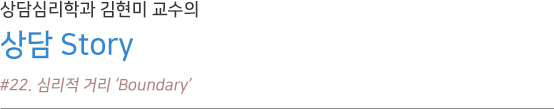

‘거리두기’ 라는 단어가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동양 문화권에서 거리두기는 좀 차갑고 정없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초등학교 시절, 책상 가운데 선을 그어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조금이라도 선을 넘는다 싶으면 짝꿍을 째려보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면서 내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던 것 같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랑 잘 거야’ 라며 밤마다 베개를 들고 오던 아들이 어느 순간 방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올 때 노크 하기를 바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 상황이 ‘경계’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었다.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탈 때 제시간에 타지 못하고 다음 버스를 탔을 경우, 외적 통제형은 ‘불가항력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적 통제형은 ‘좀 더 서둘러서 나올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똑같은 실패라고 해도 두 유형의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boundary는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자아의 경계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간에 허용되는 접촉의 양과 종류를 의미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한편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를 동시에 갖는다. 이 두 욕구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또는 모)와 공생적 관계를 맺으며 일정 기간을 살아 가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분리)개별화라고 한다. 자녀가 건강하게 분리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해결되지 않은 부모의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은 부모와 자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녀를 부모에게 매여있도록 만든다.
경계를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너무 친밀해서 자녀나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알아야 하고, 뭐든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즉, 경계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경계가 너무 느슨하면 소속감을 느끼고 친밀하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사생활이 없고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개인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확보되는 반면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지인이나 직장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다보니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관계가 깨진 A씨,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우울해진 어머니를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늘 어머니 걱정에 행복하지 못한 B씨는 경계가 없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에게 심리적 자기 경계가 취약한 이유는 유년기에 견고한 자기 개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자녀를 침범하는 부모, 아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경계를 거듭 무너뜨린다.
경계는 나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선이다. 누구나 신체적, 심리적 경계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경계도 존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친밀한 가족, 애인, 친구 관계에서도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직장에서 일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나 관계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한다고 더 번거롭거나 불편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상대방이 이걸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해주는 것도 경계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다. ‘친한 사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라는 생각도 나만의 생각일 수 있다.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해서도 안된다. 먼저 물어보자.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하고 싶은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이 나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계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될 때는 간접적으로 넌지시 표현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상대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능할 때 타인이 나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