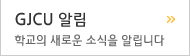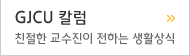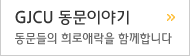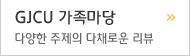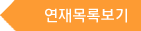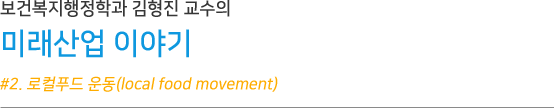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은 성장과 건강을 유지해주고 개인별 식욕과 기호를 충족해주며 가족과 사회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도 한다. 과거에는 식량자원의 부족과 종류의 제한으로 식생활이 단순했지만 현재는 식량의 생산·가공·저장 기술의 과학화로 식품의 종류와 양이 풍부해졌으며 경제수준의 향상과 소득증대로 식생활의 형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식생활의 큰 변화로 생활습관 질병인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환자, 아토피나 식품알레르기 환자와 식중독 환자가 과거보다 증가하는 등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탈피해 자연친화적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로컬푸드 운동(local food movement)과 슬로푸드(slow food) 운동, 그리고 로하스(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LOHAS : 웰빙에 사회와 환경을 추가해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생활방식)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제는 지자체들도 로컬푸드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화성시등의
지자체와 태안농협이 연계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했다.
이 로컬푸드 운동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해당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을 말한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면서도 최대한 지속가능한 생산방법을 사용해 특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것을 직거래나 공급체인의 단축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유통하는 농산물 및 식품을 말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물리적인 거리의 의미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농업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주체가 지속성을 고려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사회적 거리의 축소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로컬푸드 운동의 장점은 첫째, 운송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연료소비가 적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인다. 둘째,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 셋째,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 공동체를 만든다. 넷째, 지역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다섯째, 지역에서 순환되는 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에 관련 비즈니스를 창조하고 지역일자리를 늘린다.
로컬푸드의 의의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food safety), 소비자 먹을거리에 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식품시민권(food citizenship)과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소득을 높이는 푸드달러(food dollar)를 확보하는데 있다.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섭취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거리를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라고 하는데, 식품이 생산·운송·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소요된 거리를 말한다. 푸드마일리지 값이 클수록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지며 식품을 운반하는 선박과 비행기의 탄소배출량이 많아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이러한 푸드마일리지 값을 줄이는 방법이 로컬푸드 운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도심공터나 빌딩옥상 등에서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미래 먹을거리의 세계적인 추세는 농협과 지자체들이 로컬푸드 계획을 뛰어넘어 대도시의 푸드 시스템을 만드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먹을거리는 상황들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먹을거리를 보는 관점의 변화와 도시농업주의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도시와 농업의 관계 재설정”이 커다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농업도시주의의 구현 방법으로는 첫째,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경험하게 하며 둘째, 지역가공과 유통체계를 지원하고 셋째, 도소매·음식점·급식 등에 제공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비공식적 배움의 기회를 늘리고,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며, 지역주민 모두가 잘 먹는 상태를 보장하고, 먹을거리와 농업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들을 구현할 때 한국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